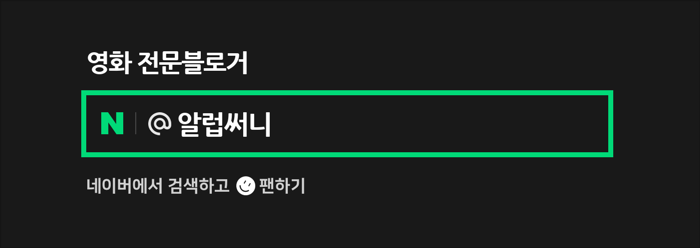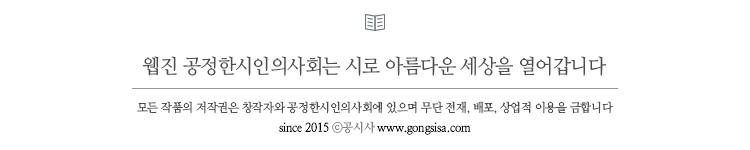
전통적인 은유의 장치를 모두 제거한 뒤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가진 시편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장식적인 형용사를 단숨에 잘라낼 때 간결하고 강렬한 시가 나온다. 군말을 빼는 것은 시조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시조는 태동 때부터 세 줄의 짧은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간결하고 선명한 말만 골라 쓰는 것이 미덕이다. 프랑스 패션계에선 코코 샤넬이 단순하지만 우아함으로 패션의 모더니즘을 열었다. 화려한 레이스와 겹겹이 몸을 감싸는 천에 갇혀 있던 여성의 몸이 샤넬을 통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시조 텍스트도 필요한 말만 골라내도록 구조화돼 있다. 이종문 시인의 텍스트가 특히 그렇다. 시인 이정문의 시를 읽으면 엉뚱하다는 우리말이 생각난다. 그는 전경도, 후경도 없이 갑자기 대상, 즉 오브제(objet)를 들이댄다. 그 효과는 종종 역설적이어서 예측 밖이었다. ‘웃지 말자’라는 제목의 텍스트를 읽지 않고도 읽을 수 있는 독자는 드물 것이다. ‘잘까?’는 더더욱 그렇다. 설명도 감정이입도 없이 텍스트는 두 인물의 대화로만 구성돼 있다.
-ㄹ까?
그래, 자자
그래, 자, 자꾸…
자나?
아니야, 안 자
자지와
잠이 안 온다…
갑자기
응, 그래, 자자…
자나?
아니야, 안 자
- 이정문 ‘자니?’ 전문
‘자다’라는 단순한 동사 하나가 이 시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유일한 소재이다. 우리가 텍스트와 작품을 부를 때 텍스트는 실로 짠 직물, 즉 텍스타일(textile)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종문 시인의 잠자라? 텍스트는 한 실, 예를 들어 엉성한 면사 하나로 짠 단순한 직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심이 결코 둔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실이 가로, 세로 교차해 정교한 결과를 낳았다. 양쪽 끝에 이렇게 섬세하냐 무명천에 다시 무명실로 실을 수놓아 하얀색 하나가 채도를 달리하며 서로 얽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똑같이 서로 다른 무늬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무늬가 다른 형상을 환기시키며, 상상 속에 떠오른 또 하나의 그림이 잇달아 그려지는 것 같다.인물1의 발화는? 자?로 압축된다 막판에 가서 잘 거구나. 하는 인물1의 의문사는 인물2로 전이되면서 반복된다. 잘 거냐고 묻던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 돼서 잘 거냐는 질문에 대답하던 사람이 같은 질문을 되묻는다. 처음 물어본 사람에게 되받아치는 것이다. 인물 1도, 인물 2도 한 마음이어서 누가 누구든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잠을 서로 자라고 권하면서도, 먼저 잠들 수도 없는, 그리고 상대가 자고 있는지 계속 묻고 있는 관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이겠지. 상대에게는 「이제 가」라고 부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되돌아가지 못한다.같이 먹는 것, 같이 자는 것 그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앞에서는 사랑이란 말이 무색하다. 사랑이란 말을 발화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만다.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 ‘술라(Sula)’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묻다. 할머니는 전혀 다른 별에서 날아온 외계인처럼 상상 밖의 대답을 해 준다. 손녀가 화성인이면 할머니는 금성인인 셈이다. 사랑?나는너를먹였다사랑이란그렇게그대상을먹이고돌보는것이다. ‘자다’에서 파생된 말이 밤늦게까지 유희한다. 어미를 같이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미를 변화시키며 잠을 못 이루는 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된다. 탁구대 위에 네트를 늘어뜨리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작은 탁구공 같은 말, 자니? 그리고 자니? 조선시대의 이종귀는 믿는다는 한마디를 여기저기 적어 한 편의 시조 교재를 만든 적이 있다.
자네를 미들일까, 미들슨 님이 시라미더 오던 시절도 미들이라고 생각해, 어리던가, 아니 미트일까?
- 이정구
믿다,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믿다, 그리고 믿기 어렵다. 믿음을 바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믿으려 하고, 믿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미리 알면서도 믿지 않을 수 없으니, 마침내 신뢰를 잃고 처음부터 다시 고쳐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이다. 수백 년 전에도 그랬던 일이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옛것을 답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뢰, 불신, 배신을 노래할 것이다. 따라서 온고지신이란 말은 시 장르에서 가장 타당하게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자다’와 ‘믿다’에 이어 ‘그리워’를 보자. 소월의 시 ‘가는 법’이 생각난다.
그립다고 말하려니까 그립다.
그냥 갈까, 그래도 한 번 더
- 김소월, 가는 길 부분
그립다는 심사가 텍스트를 추동하는 힘일 텐데, 시인은 말의 기교를 이용해 그 그립다는 심정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립다고 말할까 하면 그리움이 드러나 차라리 이대로 갈까 생각해 보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다시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 혹자는 자기 그리워서가 아니라 아니 그립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읽어야 한단다. 그립다, 아니 그립다, 그냥 간다, 그래도 그립다를 그립다로 만들어 버리려고 시적 화자는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그의 그리움이 더 절절하게 느껴진다.
믿음과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어제도 오늘도 시인들은 시를 쓴다. 내일도 다시 믿음과 믿음의 시가 나올 것이다. 그립다고 아니 그립다고 했더니 그립다 그리울 때, 아니 그립다고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없는 그 모순 속에서 소월의 시는 풍성해진다. 죽어도 눈물 흘려 오리올리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 오리 사이에 텍스트는 아직 풍부해 영원히 그럴 때 우리 시 영토가 더 넓어질지 모른다. 잘까, 잘까, 잘까, 그 말들의 유희 속에 고운 정이 스며든다 믿는다, 그립다, 잔다 시인은 사랑이라는 추상어로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다와 믿다 사이, 그립다와 아니 그립다 사이, 그리고 잔다와 아니 잔다 사이에 사랑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랑했는가?라는질문에먹이고도왔다라고대답하는것은그것이가장문학적인언술이아닐까요?
박진임■2004년 문학사상 등단. 비교문학과 텍스트의 국적, Narratives of the Vietnam War by Korean and American Writers, 평론집 이중언어, 세이렌의 항해 등이 있다. 현재 평택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